국내 첫 해외입양인 게스트하우스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손진영기자 son@
중국·에티오피아·러시아…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고아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국전쟁 후인 1955년, 전쟁고아 8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지금까지 약 24만명이 국내외에 입양됐다. 2012년에만 1880여 명이 입양됐는데 이 중 1125여 명은 국내로, 755여 명은 가족을 얻기위해 한국을 떠났다.
국내 첫 해외입양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로 2003년 7월 문을 연 '뿌리의 집' 김도현(60) 목사를 만났다.
◆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는 알아야"
'뿌리의 집'은 부모를 찾거나 모국을 알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이 한번은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지난 10년간 30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해외 입양인들에게 숙소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김 목사는 2009년 입양인들과 입양 관련 법을 살펴본 뒤 입양특례법 개정 운동에 뛰어들었고, 2012년 입양아동의 권익 보장, 국외입양 감축 등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결실을 봤다.
개정안은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일주일간 숙려기간을 거치고, 입양과정을 신고제에서 재판을 통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례법 시행 전 미혼모는 출산 직후 등 떠밀리듯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양인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신고 돼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관행을 근절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잡해진 입양 절차 때문에 입양을 중도 포기하고 오히려 많은 아기들이 버려졌다. 생모가 아기를 자기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출산 기록이 남게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그는 "아동 유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면서 부터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에는 전년보다 유기 아동의 숫자가 완만하게 증가했을 뿐"이라며 "입양특례법이 아동 유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기록이 남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풀어야할 문제다. 아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친엄마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입양의 본질은 가족의 결별로부터 시작됐다. 입양인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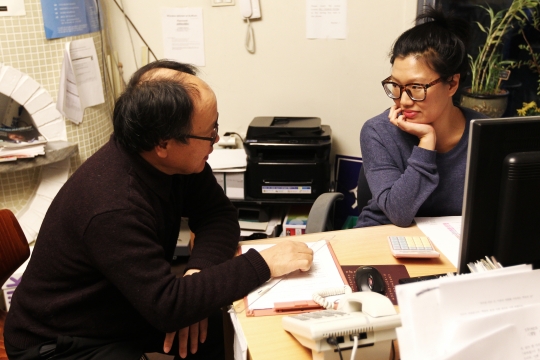
김도현 목사는 "입양인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양육시스템 필요
김 목사는 우리 사회가 입양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1960~80년대 해외 입양이 사회적 빈곤에 의해 발생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입양아의 상당수가 미혼모 자녀"라며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낳는 모든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혼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아도 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양육시스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착한 사람보다는 착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착한 제도안에서 이들이 큰 힘을 얻으니까요.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더 이상 '입양보내는 나라' 대한민국은 없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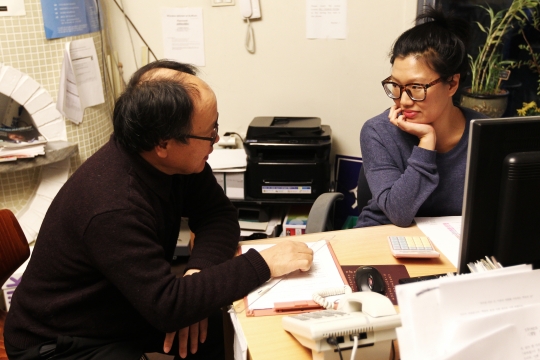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